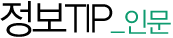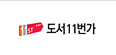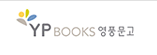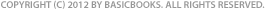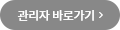정보Tip -
리빙
같은 테마의 책을 읽는다. (2)
-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5,722
교양인의 행복한 책 읽기 : 독서의 즐거움
같은 테마의 책을 읽는다. (2)
제목만 봐서는 전혀 같은 테마의 책이라 볼 수 없는 것 같지만, 실은 정말 함께 읽어야 그 테마에 대한 이해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 책이 많다.
프랑수아즈 사강의 《한 달 후 일 년 후》와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상당히 난해한 이 퀴즈의 정답은 이하영 씨가 지은 《조제는 언제나 그 책을 읽었다》에 나와 있다. 두 책은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자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 후자는 <세렌디피티>에 등장한다. 23편의 영화 속에 등장하는 23권의 책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은 《조제는 언제나 그 책을 읽었다》 덕분에 우리는 영화의 아름다운 영상을 떠올리며 색다른 독서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알퐁소 도데의 《별》의 감동을 실제 별자리에서 느끼고 싶다면, 쳇 레이모의 《아름다운 밤하늘》이나 박민호 씨의 《사계절 별자리 이야기》를 읽으면 좋겠다.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를 읽고 이 책 집필 당시 그녀의 심리상태를 알고 싶다면 그녀의 일기를 엮어 만든 《어느 작가의 일기》를 읽으면 된다. 주로 미술품에 초점을 맞춰 쓴 괴테의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을 읽었다면, 같은 이탈리아 기행문이면서 음악적 향취까지 선사하는 박종호 씨의 《황홀한 여행》도 읽는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한편 이용대의 《알피니즘, 도전의 역사》와 오빌 라이트의 《우리는 어떻게 비행기를 만들었나》를 읽었다면,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들’이라는 테마를 설정하고, 이후 슈테판 츠바이크의 《마젤란》, 롤랜드 헌트포드의 《섀클턴 평전》, 에브 퀴리의 《마담 퀴리》 등도 잇달아 읽어 나간다면 흥미가 제법일 것이다.
이처럼 ‘같은 테마’라는 기준으로 책을 선택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앞 장에서도 언급했지만, ‘같은 테마’는 한 권의 책을 읽고 다음에 읽을 책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유익하고 즐거운 기준이다. 물론 독서 초심자들에게는 다소 막연한 기준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독서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은 이렇듯 다양한 방법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며 책을 선택해 읽고, 테마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알랭 드 보통은 예술하는 철학자 혹은 철학하는 예술가, 둘 사이를 교묘하게 오가며 《불안》을 썼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장 자크 루소를 지나 버지니아 울프와 마르셀 뒤샹에 이르기까지 20여 세기에 걸친 수많은 사상과 예술을 굽이굽이 돌아보며 ‘불안’이라는 불행한 심리에 접근했다. 그의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지적인 위트와 문체 감각으로 빛난다.
보통의 《불안》에는 러셀의 책 《행복의 정복》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하지만 두 책을 꼼꼼하게 읽어 보라. 《불안》에는 《행복의 정복》의 흔적들이 곳곳에 드러난다. 이유는 둘 중 하나다. 첫째, 《행복의 정복》을 모방한 사실을 보통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둘째, 《행복의 정복》은 너무도 보편적이고 치밀하여 행복 혹은 불행과 관련한 그 어떤 책도 이 책을 비켜갈 수 없기 때문이거나. 아마도 후자가 아닐까 한다.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보통에 대해 장석주 교수는 《취서만필》에서 다음과 같은 찬사를 보냈다. “보통의 책을 읽을 때 오는 기쁨과 보람들은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독창성, 해석의 도발성과 신랄함, 문학적 수사의 뛰어남, 핵심을 찌르는 점잖은 유머들에서 비롯한다.” 《불안》도 이러한 기쁨과 보람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감각적인 디자인과 편안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판형, 그리고 인상적인 삽화와 깔끔한 번역도 돋보인다.
늘 손에 쥐고 다니고 싶은 책, 늘 가방 속에 담아두고 다니고 싶은 책, 내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 즐거운 자랑거리가 되는 책, 책 내용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책,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책, 《불안》을 읽는 즐거움은 이렇듯 다채롭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불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술적이고 학술적이며 유머러스한 자기계발서다. 정말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일깨워주는 듯하다. 그 힘은 바로 보통의 문학성에서 비롯된다. 그는 확실히 뛰어난 문인이다. 앤서니 라빈스의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에서 늘어놓는 글을 한번 읽어 보라. 예술적인가? 학술적인가? 유머러스한가? 정말 거인을 깨우는 쪽이 알랭 드 보통인지 앤서니 라빈스인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앤서니 라빈스에게서 예술과 학술과 유머를 발견하기는 힘들 것이다.
보통의 다른 책도 마찬가지지만, 《불안》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까 봐 생기는 불안’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소재를, 역사, 종교, 예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엄청난 지식들을 동원해 큰 스케일로 다룬다. 대단한 상상력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그런 큰 스케일을 동원해 일상적인 소재를 다루지만, 결말은 언제나 다시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와 우리를 들뜨게 하지도 않고 허풍스러운 위로를 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우울해지게 만들지도 않는다.
《불안》은 우리를 결코 ‘불안’해질 수 없게 만드는 신비한 마력을 갖고 있다. ‘불안’에 대해서 읽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어찌 마력이 아닌가?
 |